오늘은 덕 커브(Duck curve)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 커브(Duck curve)란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 즉 전력의 상당부분을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곳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과 같이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된 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2012년 캘리포니아주 독립망 운영체(CAISO)의 카렌 에드슨이 처음으로 덕 커브(Duck curve)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래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덕 커브(Duck curve) 의 개념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오셨나요?
저와 함께 정리해봅시다.

아래의 그래프는 사람들의 에너지 사용량(=수요,demand)곡선을 나타냅니다. 이걸 수요 곡선(demand curve)라고 하겠습니다.
시간대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전기가 어느정도는 필요하지만, 밤에서 새벽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적겠죠?
그래서 전력회사가 이 때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전기만을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일어나는 아침시간이 되면 사람들의 에너지 수요(demand)가 점점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래의 그래프에는 Morning Ramp라고 표시되어 있죠? 우리말로 하면 '아침 경사'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sunset)이 되면 사용자들의 전기 에너지 수요가 최대(Peak Demand)가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의 에너지 수요 곡선(demand curve)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모델링해야 전력회사들은 최대한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겠죠.
이전 포스팅(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이란? https://ai-and-architecture.tistory.com/7)에서, 전기 에너지는 저장하는 것보다 생산해서 바로 사용자들에게 공급하는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 그래프의 초록색 에너지 수요 곡선(demand curve)을 잘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용자 수요 곡선(demand curve)이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0년쯤 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은 미국에서도 주로 캘리포니아에 설치되기 시작해요.
많은 연구자들은 곧 캘리포니아의 전력 수요와 공급현상을 주의깊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태양광 발전량을 나타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연구자들은 한낮(mid-day)에 가장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수요 곡선(demand curve)이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래 그래프를 함께 살펴볼게요.
원래 태양광 발전량이 없을 때는 수요 곡선이 회색(LESS SOLAR)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많은 전기가 공급되면서부터는 수요 곡선이 하늘색(MORE SOLAR)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늘어나요.
2013년, 2014년, ....2020년으로 갈수록 태양광 설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태양광 설비에서 오는 전기량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서 한낮(mid-day)의 에너지 수요(demand)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래 그래프의 노란색 곡선(2020)처럼 수요 곡선(demand curve)이 바뀌었어요. 이걸 연구자들은 덕 커브(duck curve)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덕 커브(Duck Curve)는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가 많이 세워진 캘리포니아 지역의 전력 수요와 공급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덕 커브(Duck Curve) 의 머리 모양부터 봅시다.
해가 진 후에는 태양광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그런데 앞서 이 시간대에는 보통 사용자 전력 수요가 최대 수요(Peak Demand)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때 급전 가능 발전소(태양광 발전소가 아닌)에서부터 급하게 발전량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지역의 발전소는 대부분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됐어요.
이미 인프라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발전소들은 하루종일 가동되는 것이 잠깐만 가동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한낮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꺼두었다가, 해진후에만 잠깐 가동한다? 이건 너무나 비경제적인 방법입니다.

또, 덕 커브(Duck Curve)의 배 부분을 살펴볼게요.
한낮에는 사용자 수요보다 태양광 발전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때는 태양광 패널의 작동을 잠시 꺼두어야 합니다. 이걸 전력 출력제한(Curtailment)라고 합니다.

만약 태양광의 전력을 출력제한(Curtailment)을 하지 않으면, 오버로딩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파워 그리드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만들어서 쓸수 있는 전기에너지를 잔뜩 버리는 것과 같죠.

이 아까운 전기를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에 저장해두었다가 태양광 에너지가 없는 밤 시간대에 쓰면 어떨까요?

그러나 앞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용량의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저장장치의 설치 비용이 훨씬 커서 배보다 배꼽이 큰 격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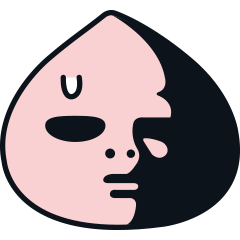
자, 이렇게 덕 커브(Duck curve)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분명 태양광 에너지는 참 좋은 신재생 에너지인데,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

'건축 에너지 정책 & 인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구기관탐방🔎] 실내환경 & 건물 에너지 연구는 누가 할까? – 한국편 🇰🇷 (0) | 2025.04.09 |
|---|---|
| [건물 에너지 인증 비교] 에너지스타 vs LEED, 뭐가 다를까? (1) | 2025.04.08 |
| [건물 에너지 인증제도] 에너지스타(Energy Star)란? (1) | 2025.04.08 |
| [건물 에너지 정책 비교] 국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vs 미국 BECP (0) | 2025.04.08 |
| [전력 / 에너지] 수요 반응(Demand Response)이란? (3) | 2024.02.29 |



